故 김기영 감독에 대한 오마주로 반세기만인 2010년 다시 리메이크 된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하녀>.
리메이크 작품의 태생적 한계라고 표현해도 될까?
원작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할 몫이리라. 하지만 많은 평론가들이 혹평과 호평을 넘나들며 이야기 해온 것이기에 그건 그냥 지나치고 싶다.
故 김기영 감독의 영화 <하녀>가 그 시대의 사건에서 모티브를 가져 온 것이듯, 2010년의 <하녀>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그것도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말이다. 그래서 21세기의 <하녀>에는 냉기가 서려있다.
슬픈 현실에도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그 때문 일게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호화로운 미장센(화면 속에 담기는 이미지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주제를 드러내도록 하는 감독의 작업을 의미). 과연 저런 대저택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태생적 최상류층 훈(이정재 분)의 집은 보는 이들을 주눅 들게 만든다. “노력”하는 삶만으로는 결코 가질 수도, 탐낼 수도 없는 것이기에.
계급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층은 존재하는 사회. 하지만 그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층 내에 더 세분화되어 있는 계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부(富)를 고스란히 되물림 받은 훈, 부부지만 그 부로 인해 훈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해라(서우 분), 이들 집주인의 오랜 하수인인 늙은 하녀 병식(윤여정 분), 새로 온 젊은 하녀 은이(전도연 분). 이들 네 사람의 관계는 태어나자마자 계급을 부여받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훈의 유혹, 그 욕망의 손길을 맞잡은 은이.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훈이 내민 수표 한 장 이상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임신한 태아조차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지킬 수 없게 된다.
은이의 몸은 하녀로 고용됐을 때 이미 그 대저택의 최상류층에게 저당 잡힌 셈이 된 것이다.
해라와 해라 모친(박지영 분)의 계략을 돕는데 병식은 주저하지 않는다. 이미 오랜 시간 몸에 익숙해져버린 하수인 본색. 그들에게 건네받은 돈봉투에는 같은 처지의 은이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이 들어있다.
그들의 뜻대로 은이의 태아는 유산되고, ‘찍’ 소리라도 내야겠다는 그녀는 최상류층인 그들 앞에서 분신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앞에 미안해하는 이도, 슬퍼하는 이도 없다. 그래서 그녀의 죽음은 더 욱 슬프다.
결국 대저택을 떠난 병식과 분신으로 생을 마감한 은이를 대신한 자리에는 새로운 3명의 하녀가 자리하고 그들 아이의 생일파티는 여전히 최상류층다운 위용(?)을 자랑한다.
마치 은이의 사건이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영화는 무섭도록 차갑다. 최상류층에게 소리 낼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 하지만 그 마저도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권선징악(勸善懲惡) 따위는 이제 고어(古語)가 되어 버린 시대.
물론 훈과 은이의 관계까지 감싸 줄 순 없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차단되어 버린 계층 간 이동을, 현재의 삶이 이미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계급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의 답답함을 <하녀>는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 영화가 어떠한 해결책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지 모른다.
은이의 죽음...그건 어쩌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래서 슬픈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저 한숨이 세어 나올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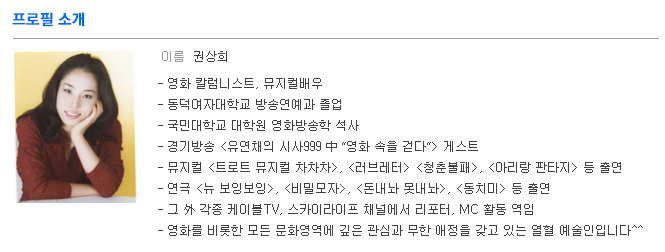
[저작권자ⓒ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한스타연예인야구] 1루수이자 4번타자! 배우 김명수, 맹활약으로 인기상 수상!!](/news/data/20251120/p1065601506017242_316_h2.jpg)
![[한스타연예인야구] 영화감독 장진, 3타수 2안타! 감독님이 이렇게 잘한다고!](/news/data/20251120/p1065601557171680_769_h2.jpg)
![[한스타연예인야구] 강민혁 미쳤다! 3안타 전타석 출루로 MVP 수상!!](/news/data/20251120/p1065601469727763_944_h2.jpg)




